정보디스플레이학과 진성훈 교수 인터뷰
학계와 산업계, 국내와 해외 경험으로 융합 역량 길러
올해 초 국립대학에서 경희로 자리를 옮긴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진성훈 교수는 일상의 호기심을 첨단 기술로 해결하는 연구자다. 최근에는 ‘커피 찌꺼기 활용 일회용 배터리’, ‘자기 소멸형 메모리’, ‘급성 구획 증후군 진단 센서’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연구는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IF: 6.4), 자기 소멸형 보안 메모리 논문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IF: 10.383), 급성 구획 증후군 관련 논문은 『Advanced Science』(IF: 14.1)에 각각 게재됐다. 진 교수를 만나 최근의 연구 성과와 연구를 기획하는 방향성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압력, 산소포화도, 혈류 실시간 측정 멀티모달 센서 개발
Q. 최근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가 ‘소재의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
연구자로서 새로운 소재의 개발만큼 기존에 개발된 소재와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통합하는 방식(Integration)에 관심을 가졌다. 소재는 목적이 아니다. 연구의 목표를 이룰 수단이다. 연구실의 이름인 ‘HIGH(Hybrid Integration for Geunine Hyper-functionality Laboratory, 하이브리드-초기능-집적화연구실)’에도 이런 철학을 담았다. 디스프레이, 메모리, 바이오메디컬, 보안 등 각 분야의 핵심 기술을 융합한다. 융합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나 보안 취약성과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의 방점을 두고 있다.
Q. 연구 성과들을 돌아보자. 첫 번째 연구는 초소형 멀티모달 센서를 활용해 기존의 ‘급성 구획 증후군(Acute Compartment Syndrome, ACS)’ 진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성과다. 기술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급성 구획 증후군’은 한 연예인의 사례로 알려진 질환이다. 신체 특정 부위의 근육이나 조직이 압박받으며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응급 질환이다. 혈류가 차단되고 조직 괴사가 빠르게 진행돼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생존율과 후유증 최소화에 결정적이다. 24시간 안에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마비나 특정 부위 절단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기존의 진단은 의사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거나 주사로 간헐적인 압력 측정으로 이뤄졌다. 오진율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다. 압력도 단일 압력만 측정한다. 측정값의 변동성과 환자 상태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오진이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연구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획 압력, 조직 산소포화도(StO2), 혈류를 동일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멀티모달 센서 프로브를 개발했다. 센서는 직경 4㎜, 두께 1㎜에 불과한 초소형 구조다. 유연하고 생체에 적합한 소재를 사용했다. 인체 삽입에도 적합하다. 센서를 한 번 삽입하면 세 가지 생체 정보를 동시에 측정한다. BLE(Bluetooth Low Energy) 기반 무선 전송 기능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외부 기기에 전송한다. 이를 활용해 AI 기반 진단에 활용한다. 의사의 진단을 돕고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진단은 의사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거나 주사로 간헐적인 압력 측정으로 이뤄졌다. 오진율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다. 압력도 단일 압력만 측정한다. 측정값의 변동성과 환자 상태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오진이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연구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획 압력, 조직 산소포화도(StO2), 혈류를 동일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멀티모달 센서 프로브를 개발했다. 센서는 직경 4㎜, 두께 1㎜에 불과한 초소형 구조다. 유연하고 생체에 적합한 소재를 사용했다. 인체 삽입에도 적합하다. 센서를 한 번 삽입하면 세 가지 생체 정보를 동시에 측정한다. BLE(Bluetooth Low Energy) 기반 무선 전송 기능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외부 기기에 전송한다. 이를 활용해 AI 기반 진단에 활용한다. 의사의 진단을 돕고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진성훈 교수는 기업과 대학, 국내와 해외를 모두 경험한 연구자다. 그는 기관의 영향력을 살리는 연구를 통해 인류에 도움되는 연구를 수행하려 한다.
습도와 수분에 반응해 물리적 파괴되는 자기 소멸형 메모리
Q. 두 번째는 자기 소멸형 메모리 연구다.
세슘 다이오다이드(Csl) 기반의 ‘자기 소멸형 저항 변화 메모리(Resistive Switching Memory)’ 구현을 앞당길 핵심 기술이다. ‘트랜지언트(Transient)’, 즉 스스로 사라지는 기술이 핵심이다. 보안을 위한 궁극적 해법을 모색하다 태동한 기술 분야다. 2010년 이란의 접경 지역에 미국 드론이 추락했었다. 적군이 드론을 분해해 정보를 모두 확보했다. 이 사례를 통해 ‘넘어간 정보의 파괴’를 목표로 원격 자폭 메모리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물리적 해체(Physically Dissoluble)’라는 개념이 있다. 기존 메모리 소자는 전기적으로 삭제해도 일정 수준의 흔적이 남는다. 복구 프로그램이나 해킹으로 정보가 재생될 수 있다. 고습이나 물 접촉과 같은 조건에서 소자 자체가 완전히 녹아 사라지며 정보를 물리적으로 파괴한다. 응답성과 내구성도 높고, 환경친화적이며 응용 확장성도 있다. 녹을 때 잔류물 없이 완전히 용해한다.
안보, 의료, 금융, 우주 산업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군사 작전 중 회수할 수 없는 장비나 일회용 의료 진단 센서, 금융 인증 시스템, 우주 탐사용 임시 전자소자 등 고위험·고보안 환경에서 응용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브레인 해킹(Brain Hacking)’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다. 뇌에 삽입한 장치가 해킹되더라도 정보 자체를 물리적으로 녹여 사라지게 한다. 강력한 정보 보호 플랫폼이다.
‘물리적 해체(Physically Dissoluble)’라는 개념이 있다. 기존 메모리 소자는 전기적으로 삭제해도 일정 수준의 흔적이 남는다. 복구 프로그램이나 해킹으로 정보가 재생될 수 있다. 고습이나 물 접촉과 같은 조건에서 소자 자체가 완전히 녹아 사라지며 정보를 물리적으로 파괴한다. 응답성과 내구성도 높고, 환경친화적이며 응용 확장성도 있다. 녹을 때 잔류물 없이 완전히 용해한다.
안보, 의료, 금융, 우주 산업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군사 작전 중 회수할 수 없는 장비나 일회용 의료 진단 센서, 금융 인증 시스템, 우주 탐사용 임시 전자소자 등 고위험·고보안 환경에서 응용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브레인 해킹(Brain Hacking)’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다. 뇌에 삽입한 장치가 해킹되더라도 정보 자체를 물리적으로 녹여 사라지게 한다. 강력한 정보 보호 플랫폼이다.
환경 친화적 기술로 활용 가능성 높은, 생분해 일회용 배터리
Q.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생분해 일회용 배터리’는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응용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데 개발 방식도 궁금하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명하다. 매일 막대한 커피 찌꺼기가 발생한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데, 환경에 영향을 적게 줄 방법을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생분해 배터리의 프레임 소재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커피 찌꺼기를 다공성 구조의 프레임 소재로 가공하고, 마그네슘 합금(AZ31)과 삼산화몰리브덴(MoO3)을 전극으로 사용해 생분해되는 일회용 배터리를 만들었다.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비가 오거나 습도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피며 자연스럽게 분해된다.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60일 이내에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구조를 구현했다. 이 프레임은 단순한 전극 구조 외에도 센서나 회로 등 다양한 전자소자와의 통합이 쉬운 프레임형 구조로 설계됐다.
수거가 불가능한 지역의 환경 모니터링 상황을 상상해 보자. 마이크로플라이어(microflier)에 이 센서를 탑재해 공기 질(오존, 이산화질소 등)이나 산불 위험 지표를 감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전자 폐기물 없이 지속 가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커피 찌꺼기를 다공성 구조의 프레임 소재로 가공하고, 마그네슘 합금(AZ31)과 삼산화몰리브덴(MoO3)을 전극으로 사용해 생분해되는 일회용 배터리를 만들었다.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비가 오거나 습도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피며 자연스럽게 분해된다.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60일 이내에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구조를 구현했다. 이 프레임은 단순한 전극 구조 외에도 센서나 회로 등 다양한 전자소자와의 통합이 쉬운 프레임형 구조로 설계됐다.
수거가 불가능한 지역의 환경 모니터링 상황을 상상해 보자. 마이크로플라이어(microflier)에 이 센서를 탑재해 공기 질(오존, 이산화질소 등)이나 산불 위험 지표를 감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전자 폐기물 없이 지속 가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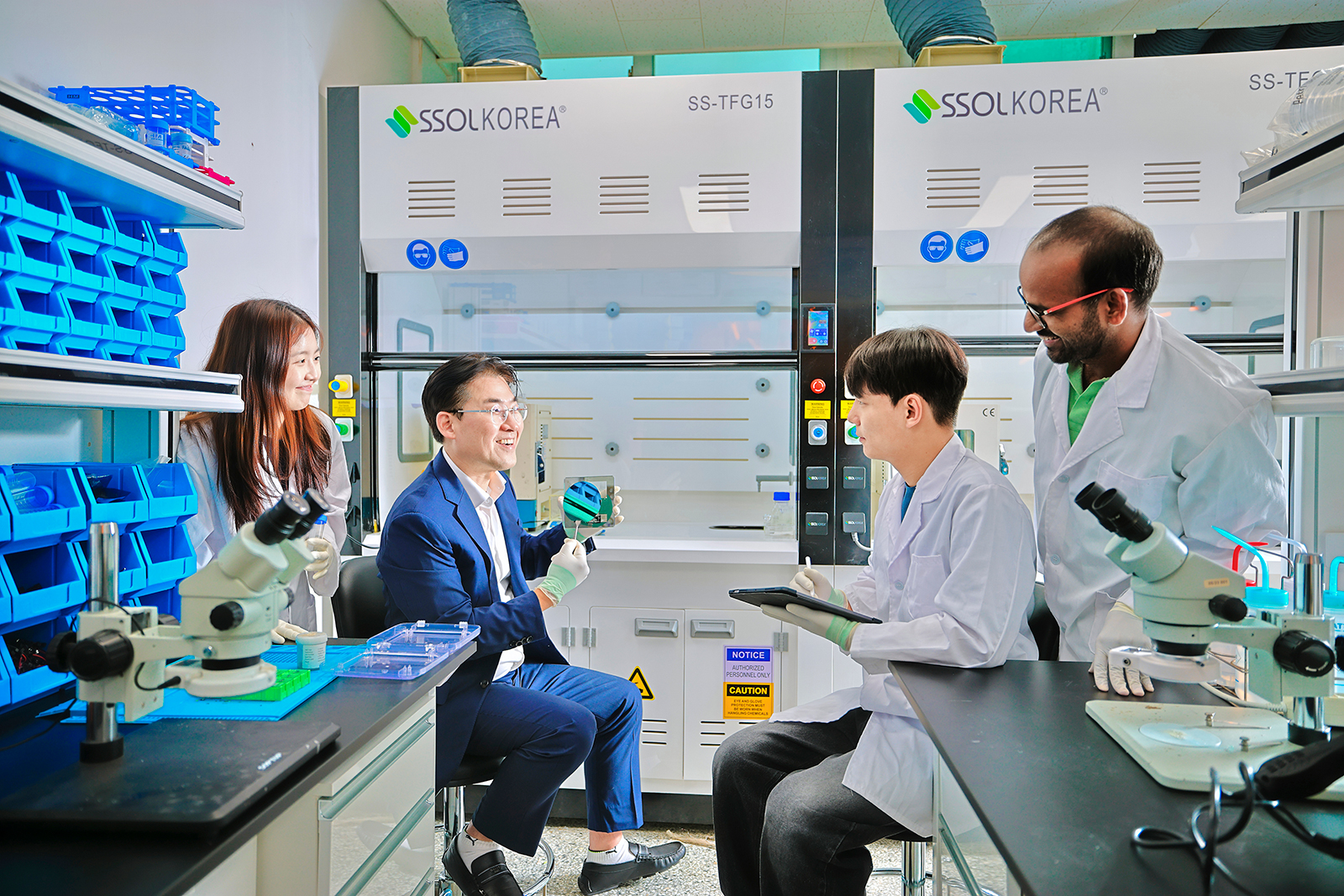
융합 연구는 진성훈 교수가 연구의 혁신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방편이다.
융합 연구로 연구의 혁신성과 신뢰성 확보
Q. 연구 과정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학술 연구는 세계 최초와 같은 ‘혁신성(Novelty)’이 중요하다. 산업화나 실용화 분야에서는 성능의 ‘신뢰성(Reliability)’과 ‘재연성(Reproducibility)’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둘 사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생긴다.
구획 증후군 진단 센서 개발 과정에서는 압력 센서를 작게 만들 때 발생하는 ‘이력 곡선(Hysteresis)’ 문제가 고질적이었다. 압력이 0에서 100으로 올라갈 때와 100에서 0으로 내려올 때, 측정 궤적이 같아야 신뢰할 수 있다. 소형 센서의 경우에는 이 궤적이 달라진다. 상용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멤브레인(Membrane) 기술을 조작하고, 폼 팩터(Form Factor)에 맞게 정밀화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센서 중 가장 높은 신뢰성을 구현했다. 새로운 물질의 개발을 넘어 기존 기술을 잘 조립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함을 배웠다.
구획 증후군 진단 센서 개발 과정에서는 압력 센서를 작게 만들 때 발생하는 ‘이력 곡선(Hysteresis)’ 문제가 고질적이었다. 압력이 0에서 100으로 올라갈 때와 100에서 0으로 내려올 때, 측정 궤적이 같아야 신뢰할 수 있다. 소형 센서의 경우에는 이 궤적이 달라진다. 상용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멤브레인(Membrane) 기술을 조작하고, 폼 팩터(Form Factor)에 맞게 정밀화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센서 중 가장 높은 신뢰성을 구현했다. 새로운 물질의 개발을 넘어 기존 기술을 잘 조립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함을 배웠다.
Q. 모두 융합 연구다. 융합 연구 역량을 기른 과정을 알고 싶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산업계와 학계를 모두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유연한 융합적 사고를 익혔다. 한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존 로저스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했다. 유연 전자(Flexible Electronics) 분야의 시조 격인 연구실에서 새롭게 시작했다. 재료과학 및 나노소자 융합을 연구하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국립대로 자리를 옮겼다. 국립대에서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메모리, 바이오메디컬을 두루 아우르는 퓨전 형태의 융합 연구를 구상했다.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산업계는 상용화, 대학에서는 혁신성을 추구한다.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혁신을 찾는 균형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희대로 왔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통합해서 세상에 없는 고성능 기술을 만들고자 한다.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국립대로 자리를 옮겼다. 국립대에서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메모리, 바이오메디컬을 두루 아우르는 퓨전 형태의 융합 연구를 구상했다.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산업계는 상용화, 대학에서는 혁신성을 추구한다.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혁신을 찾는 균형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희대로 왔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통합해서 세상에 없는 고성능 기술을 만들고자 한다.
지금의 학생, 단일 학문으로 평생 보낼 수 없어 공부해 대학으로 돌아오는 미래 꿈꿔
Q. 연구자로서 지향하는 미래 기술 융합의 목표와 로드맵도 궁금하다.
단기적 목표는 개발한 센서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 한다. 구획 증후군 진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억 원 규모로 크지 않다. 우리가 개발한 압력 측정 플랫폼 기술을 수두증(Hydrocephalus) 진단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약 10조 원 규모다. 후속 버전으로 뇌에 삽입해 뇌압을 측정하는 초소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기존 연구의 융합이다. 예를 들면 생분해 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트랜지언트 센서를 가진 자기 소멸형 메모리로 정보를 보호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 및 친환경 전자기기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팀이 되겠다. 2020년에 연구 성과들을 모아 ‘엠패치아’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연구실의 기술을 논문으로만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정밀성도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연구실 구성원의 성장도 보람이 있다.
궁극적 목표는 기존 연구의 융합이다. 예를 들면 생분해 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트랜지언트 센서를 가진 자기 소멸형 메모리로 정보를 보호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 및 친환경 전자기기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팀이 되겠다. 2020년에 연구 성과들을 모아 ‘엠패치아’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연구실의 기술을 논문으로만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정밀성도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연구실 구성원의 성장도 보람이 있다.
Q. 연구실의 인재 양성 철학이 ‘연어 프로젝트’다.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국립대에서 11년 정도 근무했다. 연구실을 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생각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연어 프로젝트’다. 학생의 진로를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지금의 학생이 살아갈 시대는 한 전공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국내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이후에 해외로 나가 더 공부하길 바란다. 부화 장소로 회귀해 산란하는 연어처럼 학생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실제로 국립대에서 처음 가르친 제자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국내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성과도 있었다.
경희대에서 이 프로젝트의 시즌2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가진 역량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들을 성장시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겠다. 경희의 품에서 성장한 학생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대학으로 돌아와 경희의 이름을 알리는 미래를 꿈꾼다. 대학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경희의 철학인 문화세계의 창조에 깊이 공감한다. 학생들이 문화를 창조하는 인재가 되도록 비전을 심는 일이 교육자로서 추구해야 할 목표다.
경희대에서 이 프로젝트의 시즌2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가진 역량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들을 성장시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겠다. 경희의 품에서 성장한 학생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대학으로 돌아와 경희의 이름을 알리는 미래를 꿈꾼다. 대학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경희의 철학인 문화세계의 창조에 깊이 공감한다. 학생들이 문화를 창조하는 인재가 되도록 비전을 심는 일이 교육자로서 추구해야 할 목표다.